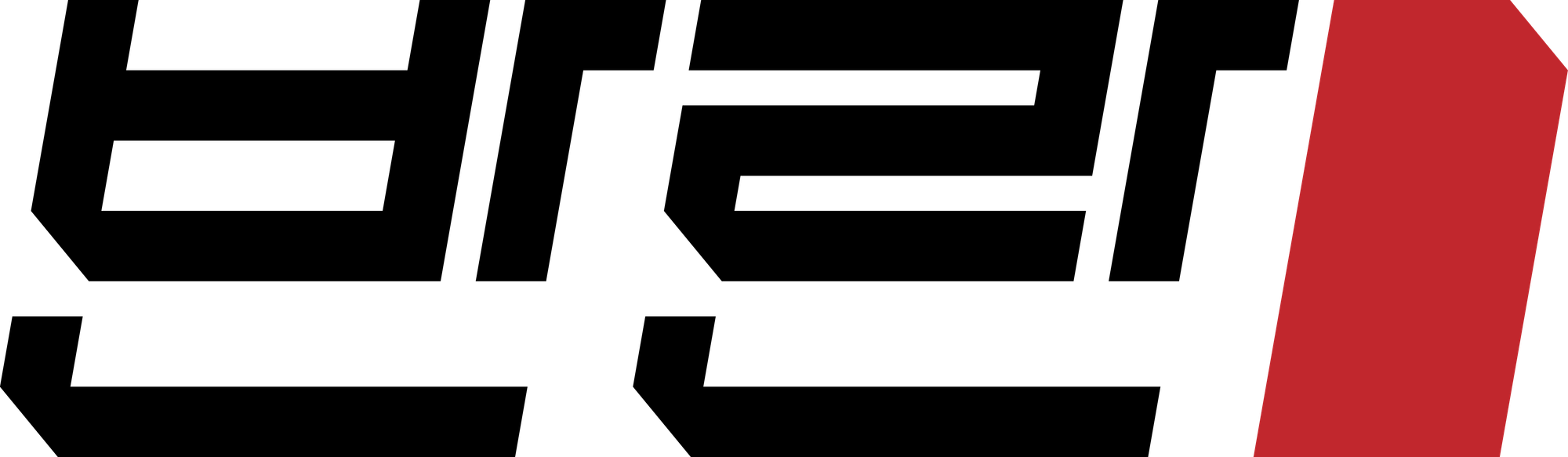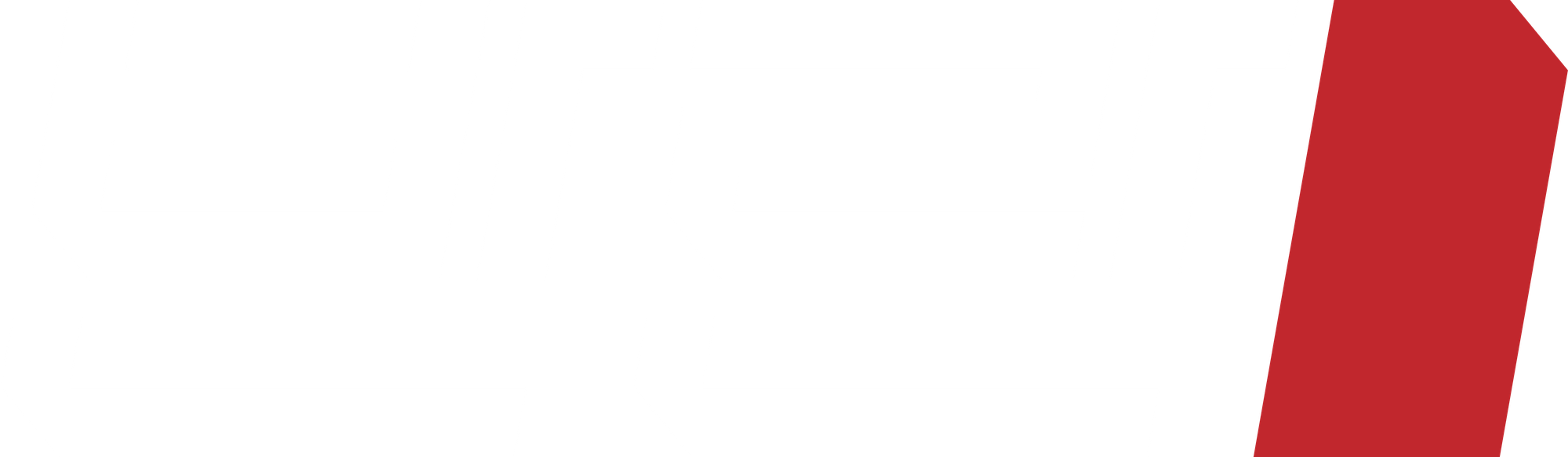마틴 니콜라우스, 1975
원글 링크
16. 새로운 시스템(the New System)
알렉세이 코시긴 소련 수상은 1965년 9월 연설에서 “기업과 협회의 경제적 독립성과 주도권을 확대하고 우리 경제의 주요 경제 단위로서의 기업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한 완전한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 중앙위원회와 정부의 최고 기관을 대표하여 코시긴이 내세운 “제안”은 재빨리 공식적으로 공포되었다. 5만 개가 넘는 비농업 기업들의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그 조치의 광범위한 성격으로 인해 복잡하고 까다로운 과업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몇 년이 걸리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며 이루어졌다. 1968년 말, 새로운 시스템은 전체 공업 생산의 72%를 생산하고 공업에서 실현된 전체 이익에 80%를 기여한 공업 기업들을 아우르게 되었다. 1970년 말에 그 수치들은 각각 92%와 95%가 되었다. 달리 말해, 그 조치들은 완전하고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N. Y. Drogichinsky, "The Economic Reform in Action," in Soviet Economic Reform: Progress and Problems Moscow, 1972, pp. 200, 202. Drogichinsky is head of the Department of New Planning Methods of the USSR State Planning Committee.)
새로운 시스템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인용문으로 독자들을 지치게 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코시긴의 주요한 구체적인 제안들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기업들의 경제적인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위에서”, 즉 계획부서에서 “할당한 지수들의 수를 줄일 것이 제안된다.”
“기업소들이 효율성을 지향하도록 하려면 수익성 지표인 수익지수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익의 규모는 국가의 순이익에 대한 기업의 기여를 그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소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일 방법을 모색”하도록 “장려될” 것이다.
사실상 모든 기업소의 이윤이 국가로 귀속되는 시스템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대신에, "할당된 고정자산을 활용하는 효율성에 비례하여, 기업소들에게 더 많은 부분을 맡길 필요가 있다."
또한 "이윤과 생산수익성을 증가시키는 기업소의 성과들이 기업소의 직원들의 수익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는" 상황에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물질적 유인기금"과 "생산발전기금" 등 기업수익성에 맞춘 새로운 일련의 "기금들"이 조성되어야 한다.
게다가, “기업소들은 유동자본, 감가상각충당금, 그리고 잉여장비의 판매자금과 기타 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사용에 있어 보다 광범위한 힘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업소들은 한 해동안 임금기금에서 절약된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광범위한 힘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예가 모스크바 교통조합인데, 새로운 시스템이 전 해 실험적으로 도입되었다. 불필요한 트럭과 장비들을 판매하고 불필요한 인력을 고용하기를 중단한 이후로 그 기업소는 상당한 생산성의 향상을 보여주었다.”
다른 기업소들과의 관계에 있어, 각 기업의 ‘경제적 책임’은 강화될 것이다. “제조 기업과 소비재 기업 사이의 직접적인 연결은 원자재 공급의 영역에서 더 광범위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가격에 대해서는, “산업생산의 경제적 자극의 새로운 형식과 방법으로의 전환은 가격 형성시스템의 개선을 필요로 한다. 가격은 점점 더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력 지출을 반영해야 하며, 생산과 회전비용을 충당해야 하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각 기업소의 이익을 확보해야 한다.”
기업소와 국가간의 금융관계도 역시 다른 토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자본투자를 위해 기업소들에 국가가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은 제한되어야 하며, 신용거래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흐루쇼프가 설치한) 지역경제위원회를 대신하여 각 주요산업 갈래에 중앙부처가 설치될 것이며, 동시에 각 부처들과 긴밀하게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조직, 즉 원가계산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갈래의 통합”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 부처들이 “많은 운영 기능”을 이전한다. 새 부처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일”할 것이며, “이전의 부처들로의 단순한 복귀는 많은 새로운 요소들을 무시하고 실수를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여기게 될 것이다.
코시긴의 명료하지 않은 정식화만 가지고도 새 조치의 뼈대들은 모습을 드러내보여준다. (Quotations are from Izvestia, Sept. 28, 1965, translated in the review Problems of Economics, October 1965, pp. 3-28)
만약 코시긴이 이 모든 것을 요약해서 “친구와 동지 여러분, 간단히 말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자본주의를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최신식 자본주의에는 트러스트들과 독점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찌꺼기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빠르게 없애버려야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는 전 세계의 맑스-레닌주의자들이 막대하게 노력을 쏟는 것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헛된 꿈이다! 그러한 신선한 결말 대신에 코시긴은 확신에 가득차서 새로운 조치들이 “소련에서의 사회주의적 소유가 공산주의적 소유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의 필수적인 일부라고 결론지었다.
코시긴은 “V. I. 레닌은 각 기업소는 수익성 있는 기반 위에 세워져야한다고, 즉 수입으로 지출을 완전히 충당하고 이윤을 창출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공표한다.
요컨대, 소련 지도부가 지시한 방향으로 행진하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은 공산주의로 향하는 길을 막을 뿐만 아니라–그래서 문자 그대로 반공주의자일 뿐만 아니라–레닌에게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다!
소위 레닌주의 언론들이 레닌의 실제의 말을 다루지도 않고, 그것을 코시긴과 지도부 전체를 아침부터 자정까지 비판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1965년의 레닌의 나라의 정치 풍토를 폭로하는 비판이다. (언론들은 당연히, 소련 지도부에 의해 통제되었다.) 레닌은 기업소의 이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수익기반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국영기업이 전환되는 것은 신경제정책과 필연적이고 불가분의 관계이며, 틀림없이 가까운 미래에 유일한 것은 아닐지라도 지배적인 국영기업의 형태가 될 것이다. 사실, 이것은 자유시장이 현재 허용되고 발전함에 따라 국영기업이 대부분 상업자본주의적 토대 위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생산성을 증진하며 모든 국영기업들이 자활하고 이윤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긴급한 필요성의 관점에서, 그리고 협소한 부서의 이익과 과도한 부서의 열의의 불가피한 상승의 관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노동자 대중과 국영기업의 또는 그것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의 관리자들과의 특정한 이해의 충돌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영기업과 관련하여, 고용주들로부터 프롤레타리아트를 보호하고 노동자 대중의 계급이익을 보호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노동조합의 의무다.”(선집, 42권, 376쪽)
레닌은 전쟁과 기근의 참화에 의해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 자본주의 생산관계에 의존하도록 강요된 프롤레타리아 국가를 대표하여, 이러한 [생산]관계들을 그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더욱이 그는 이러한 [생산]관계와 결부된 “노동과 자본 사이의 계급이익의 대립”을 드러낼 것을 주장하고, 노동자들의 대중조직들이 “자본과의 투쟁에 있어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이익”의 보호를 “공개적으로 전면에 내세울 것”을 요청했다.
그렇다면 코시긴은 어떠한가? 이 부르주아 국가의 대변자는 완전하고 시간제한이 없는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도입하려는 시도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에 강제되어, 이 조치들의 “공산주의적” 성격에 대해 가장 터무니없는 가식을 늘어놓았고, 계급적대나 심지어는 “이해관계의 충돌”의 근거마저 부정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레닌의 권위를 빌려오는 배짱을 보여주었다.
레닌이 네프를 제안했을 때의 지배적인 조건은 앞서 개괄되었고–1922년 1월자로 인용된 구절(본 연재의 2부와 3부)–이 주제를 더 확장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들이 극복되고 사회주의적 생산관계가 지배적이게 되면서, 기업 이윤의 역할은 자연스럽게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되었다.
사회주의 하에서는, 특정 개별 생산단위 뿐만 아니라 전체 산업 분야들까지도 짧거나 오랜기간 동안 (어떤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된 손실”로서 운영되었다. 이러한 방식으로는 노동자들과 사무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비용을 넘어서는 초과수익, 또는 “이윤”에 대한 다른 어떤 종류의 금전적 표현도 회계장부에서 보여질 수 없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역사를 예시로 들자면 집단농장의 농부들이 더 많은 면화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원면의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었고, 반면 면직물의 가격은 노동자들과 농부들이 옷을 입을 수 있도록 낮은 가격으로 설정될 수 있었다. 면화를 직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었던 섬유산업은 필연적으로 회계장부에서 손실을 보여줄 수 밖에 없었다. 그 차액은 이윤을 보고 있는 다른 부문에서 발생한 자금의 일부를 섬유산업으로 이전함으로써 메워졌다.
국유부문에서 발생한 모든 이익은 (경미한 일부분을 제외하면) 국가로 직접 집중되었기 때문에, “수익성 있는” 부문과 단위에서 “수익성 없는” 곳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은 계획에 의해 규제되었다. 이 계획은 결국 노동계급의 당인 볼셰비키에 의해 결정된 우선순위를 반영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섬유산업의 즉각적인 이윤의 목표는 목화 농부들의 입에 들어갈 음식과 노동자들이 입을 옷이라는 더 높은 즉각적 목표에 종속되었다, 달리 말하면, 섬유산업의 “이윤”은 금전적 형태가 아니라 인민들의 필요를 충족하는 형태로 실현되었다. 후에 현대화되면서 섬유산업은 다른 곳에 사용될 수익을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노동계급의 장기적 목표 또한 단기적 목표에 관련하여 적절한 가중치가 부여될 수 있었다. 가장 중요한 예시를 들자면, 생산수단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소비재의 생산보다 더 긴 시간을 요구했고, 덜 긴급했다–그리고 훨씬 덜 즉각적으로 수익성이 있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의 확장에 의존한다. 게다가 노동을 쉽고 짧게 만들며, 육체노동과정을 덜 힘들게하고 노동일을 감축한다는 장기적인 목표는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산업 분야의 확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렇다면 고용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노동자들은 사회적으로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없는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해고되어야 하고 사치품을 생산하는 수익성있는 곳으로 이전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그냥 길거리로 내몰려야 하는가?
이와 관련한 질문들에 대해 [계급]의식의 동이 튼 이래로 부르주아 계급은 일련의 주장으로 답변해왔다. 프롤레타리아 사상가들은 그와 다른 주장으로 답해왔다. “개별 공장이나 산업의 관점에서 고려된 수익성은 우리를 과잉생산 공황으로부터 구했으며 지속적인 생산의 확장을 보장하는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에서 얻게 된 고차적 형태의 수익성과 비교되지 않는다.”(스탈린, 사회주의의 경제 문제, 57쪽) 1965년의 조치들에 포함된 “사회에 좋은 것은 기업에도 좋다”는 리베르만의 견해는 정반대이자 모순이다. 이것은 단순히 “제너럴 모터스에게 좋은 것은 경제에도 좋다”고 주장하는 더 “우아하고” 회피적인 방법일 뿐이다.
17. 노동력
구약성서의 부족들이 전능한 신의 이름을 벌벌 떨며 말했던 것처럼, 소련의 새로운 시스템을 옹호하는 이들은 노동력에 상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꺼린다.
이윤, 이자, 임대료와 같은 경제적 범주들과 관계들은 소련의 공식적인 문건에서 자유롭게 언급된다. 사실, 그러한 문건들은 다른 것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 “사회주의” 경제에서 상품-화폐관계의 미덕을 일반적인 용어로 칭찬하는 것은 상당히 허용되는 일이었고 심지어는 의무적이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력의 범주에 관한 한(그리고 이후에는 생산수단에 대해서도) 소련 경제학자들은 이상하게 입을 다물게 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매우 비타협적이었던 정치적 대변인들의 수사는 언급할 수 없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까치발로 걸어다니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1965년 코시긴의 연설에서는 노동력을 상품으로 전환해야한다는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심지어 경제적인 이유로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해고할 권한을 기업 관리자들에게 주어야 한다는 명확한 요구도 존재하지 않았다. 단지 “한 해동안 임금기금에 축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더 넓은 권한”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만이 있을 뿐이다. 어떻게 임금기금에서 돈이 축적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에 너무 멍청한 청중들을 위해 코시긴은 그림을 그린다. “불필요한 트럭과 장비를 판매하고 불필요한 인력의 고용을 중단”할 때 번창했던 다섯 곳의 운수기업소의 시범사업이 그것이다.
Voprosy Ekonomiki (1965.11.12일자)의 논평에 실린 이 시범사업에 대한 더욱 자세한 설명은 항목별로 분류된 명세서를 제공하고 있다. “많은 직원들을 해고함으로서 비용이 절감되었다. 제1운수연합기업소(Motor Vehicle Combine No. 1)에서 중앙 차고지와 건설부서가 제거되었고, 그 기능은 이전되었으며 (...) 100명의 직원이 해고되었다. 제5기업소에서는 차량의 유지 및 보수작업이 중앙으로 집중되면서 많은 수리공과 기계공들이 해고되었다, (...) 제9기업소에서는 101명의 근로자를 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의 시범 공장에서부터 발산되어 소련의 광활한 영토 전역에 걸쳐 고정되면서, 소련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사회주의적 생산관계에서 그들에게 남은 모든 것–은 이제 무너졌다. 그들은 자본주의 서방의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팔 수 있는 것이 노동력밖에 없는 임금노예인 고용된 노동자의 지위로 다시 한번 전락하게 되었다.
코시긴은 시범사업결과에 대한 요약에서 “계획과 경제적 자극에 대한 새로운 시스템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의 결과에 대해 갖는 관심을 증가시켰다”(강조는 저자가 추가)고 시니컬하게 논평했다. 그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이 31퍼센트 증대하였으며, 기업소의 이윤은 두 배가 되었다는 것을 만족스럽게 지적했다. 전국적 규모의 장기적인 결과는 몇년 후에 수집되었는데, 첫 번째 수치들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인 경향성은 같았다.
1973년 ‘투자 효율성’ 전문가인 하차투로프는 1955~65년 동안 확대되어가던 근로자 1인당 자본증가량과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의 차이가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이후 5년의 기간동안 2퍼센트로 다시 좁혀졌다는 것을 관찰했다. (이 연재물의 15장을 볼 것) 자본주의 생산관계의 채찍질은 노동자들의 소극적인 저항을 분쇄하였다. 감속은 이제 끝났다. 가속도가 붙었다.
초기의 결과가 알려지면서 소련 부르주아 계급 일부는 입맛이 되돌아오는 것을 느꼈고 새로운 경제 엔진에 연료를 마구 공급하는 방법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이 실험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967년 셰키노 화학연합기업소에서 시작되었다.
경제학자 T.바라넨코바는 셰키노 설계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에서 “셰키노 실험과 관련된 기업소에서의 인력방출은 계획되어 있었다”고 적었다. 평균적으로, 참여한 기업 각각은 노동력의 10~15%를 “방출”하였다. 그는 기업소에 따라 5분의 1에서 3분의 2 정도의 해고가 “직무의 병합”과 남아있는 노동자의 “업무량” 증대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보상으로–그리고 이것은 셰키노 방법의 새로운 측면으로 알려졌다–남은 노동자들은 동료들이 해고됨으로서 “절약된” 기금의 일부를 “보너스”로 받았다. 그 결과 결근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실험조건에서의 노동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생산활동에 있어 단기간에 긍정적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했다.” ("Technical Progress and the Movement of Personnel in Industry," Voprosy Ekonomiki, 1970, No. 2, translated in Problems of Economics, September 1970)
간단히 말해, 노예 운용의 표준적인 자본주의적 방법([작업]속도를 높이고, 한 노동자가 두 노동자의 일을 하게 함)은 살아남은 노동자들에게 죽은 전우들의 남은 “살점”을 던져주는 식인적 방식을 통해 보충되었다. 그렇지만 오직 남은 것만이다. 바라난코바는 생존자들이 받은 “보너스”는 “상당한 액수”였다고 말했다. 셰키노의 열정적인 지지자인 다른 작가 E.마네비치는 실험 중인 대부분의 공장의 “보너스”가 “매우 작다”고 말했다. ("Ways of Improving the Utilization of Manpower," Voprosy Ekonomiki, 1973, No. 12, Problems of Economics, June 1974, p. 18) 남은 “저축”은 이윤에 주어지는 “보너스”로 사용된다.
셰키노 시스템의 독창성은 증거들이 지시하듯 “보너스”의 설탕 코팅이 아니라 더욱 강력한 해고와 속도향상에 있다. 셰키노 연합 기업소의 원래의 실험에서 1000명의 노동자가 해고되었는데, 이는 노동력을 약간 “가지치기”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셰키노 원칙은 1969년 10월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으며, 1973년 말에는 약 700개의 기업소로 확장되었다. (Manevich, ibid.) 이익이 될거라고 믿는 추가적인 기업의 임원들은 언제든지 “셰키노”를 할 수 있었다.
바라넨코바는 셰키노 시스템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기업소들이 숙련노동자들이 부족한 대도시들에 위치해있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들은 협상에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이 방법을 채택한 기업소의 경제적 목표는 매우 의식적으로 부족을 공급과잉(비축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마네비치는 키로프 시의 한 기업소 임원 V. 조노프의 승리감에 가득한 어조의 말을 인용하였다. “이전에, 우리는 충분하지 않은 운전기사, 금속노동자, 선반작업자, 정비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음, 우리는 1년 반동안 셰키노 시스템 아래에서 일해왔고 알다시피 우리는 많은 경우에 노동자들의 부족이 인위적인 것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이웃의 직무를 부분적으로 맡게 되면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음으로서 우리는 말하자면 새로운 노동예비군을 발견했다. 밝혀진 바와 같이 문제는 인력의 부족이 아니라 생산의 조직과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에 있다.” (ibid, p. 17)
“이웃의 직무를 부분적으로 맡게”되어 “더 많은 돈을” 받는 노동자는 일단 예비군이 만들어지면 더 적은 비용으로 같은 노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고용인으로 대체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맑스는 셰키노 실험보다 한 세기 앞서 "The overwork of the employed part of the working class swells the ranks of the reserve, whilst conversely the greater pressure that the latter by its competition exerts on the former, forces these to submit to overwork and to subjugation under the dictates of capital. The condemnation of one part of the working class to enforced idleness by the overwork of the other part, and the converse, becomes a means of enriching the individual capitalists" . . . or enterprise directors as the case may be. (Capital, Vol. I, p. 636).
소련의 새로운 사상가들은 단기저긍로 노동예비군을 만드는 추가적인 방법을 고안하느라 바쁘면서도 장기적인 전망에도 시선을 놓지 않고 있었다. K. 베르미셰프(Vermishev)는 그 중에서도 “평균 100만명의 어머니”를 “사회적 생산”으로부터 “해방”시켜 아이들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The Stimulation of Population Growth," Planovoe Khoziaistvo, 1972, No. 12, Problems of Economics, June 1973, p. 3)
해고된 노동자들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범주에 편입된다. 부르주아적인 소련학자 마셜 골드만은 1971년에 비꼬는 어조로 “노동생산성을 가속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자본주의적 도구의 가방을 뒤지는 동안, 러시아인들은 또 다른 장치인 실업보상을 고안해냈다. 1970년 2월까지 러시아인들은 소련에 실업이 존재한다는 것을 단호하게 부인했다. 그리고 실업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보상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추론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거의 위로가 되지 못했다.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1971, p. 160)
충분히 사실이지만, 교수님은 실업보상에 대해서는 실수를 하신 듯 하다. 1969년에 이미 마네비치는 아래와 같이 썼다. “기술적 진보[속도향상의 완곡한 표현]가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활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물질적 지원에 대한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 (ibid).
이듬해 바라넨코바는 “셰키노 실험은 직업간[을 이동하는] 시간동안 (급여의 지급을 포함하여) 노동자들에게 물질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이전의 선진적 제안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1973년 말, 실업 보상이 시행된지 3년만에 마네비치는 “인력의 방출을 보장하고 인력의 합리적 활용에 도달하기 위해서 다른 많은 경제적, 법적 조치를 실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방출된 인원에 대한 물질적 지원의 문제와 같은, 긴박한 장기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고집스럽게 썼다. (Voprosy Ekonomiki, 1973, No. 12; 강조는 저자)
소련의 실업자들이 다른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실업에 대한 보상을 자본가들로부터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보인다. 비록 마네비치와 같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리버럴’이 탄원을 하더라도 말이다. 소련 노동자들의 지위는 어떤 면에서는 서구의 노동자들보다 더욱 나쁘다. 그들의 실제 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입장은 확고하다. ‘사회주의’ 하에서 노동력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실업자들은 공식적인 위선에 대해 물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된다.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의 더욱 씁쓸한 측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기업소의 관리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모든 해고는 1936년 스탈린 헌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소련 법에 엄격하게 위배된다는 것이다. 기업소들은 노동자들에게 능률 촉진과 경제적 테러를 가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수정주의 당과 국가의 지도부는 소련 헌법을 경멸한다. 그들이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할 것이라 말해왔던 것처럼 헌법을 새로 쓰는 것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개정된 헌법은 여러차례 연기되었고, 1976년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으로 노동자들의 법은 사문화 되어버렸다.
앞서 인용한 1973년의 기사에서 마네비치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직장을 옮기는데 25-30일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평균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쉬운 숙련공과, 훨씬 많은 ‘예비[인력]’이 있는 비숙련공으로 구성된다. 비숙련공이 시골에서 밀려오면서 그 수는 불어났고, 그와 평행하게 복원된 자본주의는 그들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었다. 1959년과 1970년 사이에 16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했고, 그 중 1300만명은 노동연령이었다. 연구자 L. U 에우시우코프가 관찰한 또 다른 이유는 “몇몇 기업소와 단체들이 시골지역에서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 즉 레닌이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전>에서 묘사한 차르 시대와 마찬가지로 도시가 시골을 습격한다는 것이다. ("Migration of the Population From the Countryside to the City," Planovoe Khoziaistvo, 1972, No 12, in Problems of Economics June 1973, p. 14)
게다가 이러한 이동은 반드시 안정적인 정착의 패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지점들 사이에서 지속적이고 겉보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인구이동이 존재했다. 소련 저술가들은 이를 ‘가변적 이주’(variable migration)라고 불렀다, “최근 소련에서는 가변적 이주의 규모가 어느때 보다 더 증가했다”고 인구통계학자 L.루고프스카야가 말했다. (Planovoe Khoziaistvo, 1972, No. 8, in Problems of Economics, May 1973, p. 96)
이는 노동자들과 집단농장의 농부들이 그들의 노동력이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더 낫거나 혹은 적어도 덜 억압적인 판매조건을 찾아 적극적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만약 그들이 시장에 그들의 가죽을 가져가야 한다면 적어도 최고의 가격을 받을 작정인 것이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러한 배회와 부유로 인해 잃은 생산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불안정의 사회적 비용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lanovoe Khoziaistvo(Peking Review Sept. 24. 1974에서 인용)의 추정에 따르면, 이러한 산업에서 “부유하는” 노동자들에 의해 잃게된 시간은 약 40억 루블에 해당했다.
노동력의 상품으로의 전환은 국가 전체에서 높은 ‘교환’ 비율을 가진 대규모의 노동시장을 발생시켰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얼마나 자주 직장을 바꾸려 하는지 추정하고자 시도했던 최초의 출간된 연구는 1년동안 국가 경제에 속한 모든 인원 중 59.1%가 그들의 위치를 바꾸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노동자가 같은 기업소에서 보내는 평균적인 기간은 3.3년에 불과하며 평균 12~15년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국가경제에서 매년 수천만명의 사람들이 이직을 한다”고 연구의 저자가 추정했다. “그 전체 수치는 1억을 넘는다. 대략적인 계산에 따르면 이러한 이동의 절반 이상이 생산 및 노동력의 발전의 이익와 관련되어 있다.”(V.S. Nemchenko, "Mobility of Labor Resources," Vestnik Moskovskogo universiteta, Ekonomika, 1974, No. 1; in Problems of Economics, October 1974, pp. 80-88)
간단히 말해, 경제학자도 정치적 대변인도 소련에서 노동력이 상품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현실은 충분히 명확하다. 최근의 소련의 사회학적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소련의 공식 선전이 그리는 것처럼 스스로가 ‘사회의 주인’이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
1974년 야로슬라블에서 실시된 조사에 응답한 노동계급 부모 중 78%가 자녀가 공장노동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쪽의 부모만이 공장노동자인 가정에서는 96%가 자녀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아했다.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철강노동자에 대한 선호도는 28위, 선반공은 39위, 트랙터 운전사는 51위, 목수는 68위였다. (Christian Science Monitor, Sept. 11, 1974에서 인용).
우크라이나 보로실로프의 대형 기관차 공장에서 일하는 18~25세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에서 66%는 자신의 급여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71%는 장비에 대해, 70%는 공장의 위생상태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조사 지표별로 보면 불만족률은 5년 전보다 18% 더 높았다. 노동자들은 특히 소위 “사회주의적 경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에 비판적이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한다고 한 노동자가 말했다. 다른 노동자는 “단지 허구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떤 경쟁인지 세번째 사람에게 물었다. “단지 충족시켜야 할 할당량만이 있다.”(New York Times, Dec. 2, 1973에서 인용)
18. 생산수단(I)
오늘날의 소련이 생산의 무정부적 상태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와 달리 근본적으로 계획경제로 남아있다는 믿음이 널리 퍼져있다.
이 주제는 소련 당국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대중선전기관에서 매일 낭송되어지며, “대중” 소비를 위한 어떤 수정주의적 지침서도 이것이 오늘날 소련 “사회주의” 체제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 못한다. 다른 측면에서 소련의 수정주의적 지배에 비판적이었던 많은 이들을 포함하여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이러한 주장을 동전의 좋은 면으로 받아들여왔다. 소련에서 자본주의가 어떻게 복원되었는지를 “폭로”하기 시작한 일부 사람들도 1965년의 “개혁”하에서 중앙계획이 유지되어 왔다는 말을-인용도 없이-되풀이했다.
하지만 이것은 오류다. “새로운” 소련의 경제의 근본적인 계획이 신화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고 있던 이들에는 그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아는 소련 노동자들 뿐만 아니라 계획과정에 대한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소련 경제학자들, 그리고 가장 책임이 있고 권위가 있는 소련 “계획자들” 자신들이 있다.
전문화된 학술지나 전문 출판물의 구석진 지면에서–다른 경제학자들과 “계획자들”을 청중으로 하는-전문용어의 보호막 뒤에 숨은 소련 저술가들은 그들의 단체 작업에서 발생하는 중요한 실천적 질문들을 건드림으로써 졸음을 유발하는 일반론의 낭송을 중단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 순간에 이야기는 매우 달라진다.
예를 들어 1965년 “개혁”의 “진보”에 대해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소련 국가계획위원회(Gosplan)의 새로운 계획법 부서의 책임자인 Y. N. 드로기친스키는 제8차 5개년계획(1966-70)이 불행히도 “계획된” 기간이 이미 끝나기 전에 설계도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을 다루지 못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5개년 계획을 세우는 일이 기업소부터 소련의 고스플랜에 이르기까지 지난 5년동안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소들은 할당이 년 단위로 쪼개지면서 그러한 계획을 갖지 못했다.” 조금 더 나아가 그는 “5개년 계획을 각 기업의 작업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The Economic Reform in Action," in Soviet Economic Reform: Progress and Problems, Moscow, 1972, pp. 211, 224.)
만약 계획이 작업 프로그램이 아니라면 계획이란 무엇인가?
또는 계획과 물가 사이의 관계에 대한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소련 내각의 국가가격위원회의 부위원회장인 A. 코민은 빈번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 “현대적 방법론의 잠재력”은 가격의 변동을 따라갈 수 없으며, 따라서 “5개년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냈다. ("Problems in the Methodology and Practice of Planned Price Formation," Planovoe Khoziaistvo, 1972, No. 9, translated in Problems of Economics, May 1973, p. 48.)
동일한 주제에 대해 고스플란 부국장인 V. 코토프는 “사실, 유통계획은 결코 완성된 형태를 얻지 못한다. 생산의 운영관리와 합쳐서 계획된 기간이 끝나야지만 완성된다”고 인정했다. “상당한 그리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제의 부분에서 그는 계획을 하려는 시도조차 없고 오히려 “계획의 실제적 중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계획은 “본질적으로 의미를 상실”했고 “계획의 이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다. ("Prices: the Instrument of National Economic Planning and the Basis of the Value Indices of the Plan," same source as above, pp. 62, 64, 69, 61.)
무정부적 상태에 대한 추가적인 인정은 후에 인용될 것이다. 이러한 인정이 아이러니하게도 대중매체에서가 아니라 “계획경제”를 의미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문 계획자들의 학술지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는 마치 건축이 국교인 나라의 건축 산업에서 혼돈이 일어난 것과 같다. 정치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국가 디자인의 영광을 은폐하면서 극찬하는 말을 한다. 그러나 건축가들은 어떻게든 건물이 완성되기 전에 설계도를 완성하는데 실패한 것, 건설 계획을 계약자들을 위해 “작업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계획의 입안자들이 하나를 디자인 하고 건설자들이 다른 것을 짓는 경향과 같은 고질적인 사실을 어떻게든 이해해야 한다. 소련의 “계획자”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불만은 경제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이며, 일관된 설계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소련 경제는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 도달했을까? 답은 한 마디로, 생산수단을 상품으로 전환시켰다는데 있다. 1965년의 "개혁"이 소련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상품으로 전환시켰다는 것은 이미 (이 연재물의 17장에서) 보여진 바 있다. 즉, 노동자와 "그들의" 기업소 사이의 관계는 순수히 상업적인 기반 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익을 창출하거나 아니면 쫓겨나거나.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는 1965년에 취해진 조치의 다른 한 측면으로, 생산수단에 동일한 [상업적인] 사회적 성격을 부여하였고, 국영기업 사이의 관계에 동일한 상업적 기반을 만들었다.
이 문제에 대한 사회주의적 관점은 1952년 스탈린에 의해 발전되었다.
"우리의 사회주의 체제 아래에서 생산수단이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가? 나의 의견으로는 그것은 확실히 그렇게 간주될 수 없다.”
“상품은 어떠한 구매자들에게도 판매될 수 있고, 그 소유자가 그것을 판매할 때에는 그가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구매자가 상품의 소유자가 되고, 그 구매자는 그것을 다시 판매할 수 있고 그것을 썩히는 것을 서약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생산물이다. 생산수단이 이러한 범주 내에 들어가는가? 그것은 명백히 그렇지 않다. 첫째로, 생산수단은 어떠한 구매자에게도 “판매”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심지어 집단 농장에게도 “판매”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직 국가에 의해 국가기업에게 할당될 수 있을 뿐이다. 둘째로, 생산수단을 어떤 기업에게 양도했을 때, 그 소유자–국가–는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전혀 상실하지 않는다; 반대로 국가는 그 소유권을 완전히 보유한다. 셋째로, 소비에트 국가로부터 생산수단을 수령받는 기업의 지도자들은 그것에 대한 소유자가 되기는 커녕 국가가 설정한 계획에 맞게 생산수단을 활용하는 국가의 대리인들로 간주된다.”
“그렇다면 우리의 체제 아래서는 생산수단이 확실히 상품의 범주로 분류될수 없다는 건ㅅ으로 보일 것이다.” (Economic Problems of Socialism, p. 53. 국역본은 『스탈린 선집 2』, 서중건 역, 전진출판사, 1990, 258쪽에서 인용)
여기에 더해져야 할 사실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관행에서는 기업소가 설령 생산수단을 구매할 권리를 지녔다 하더라도 거의 "구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기업소들에게는 그러한 목적을 위한 자금이 없었고, 심지어 낡은 장비를 대체할 감가상각 자금조차 없었다. 장비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거나 한 공장에서 다른 공장으로 기계가 옯겨질 때가 왔을 때-언제나 계획의 명령에 따라-상응하는 금액이 부기업무로서 중앙으로부터 할당되거나 이체되었다. (Dobb, Soviet Economic Development Since 1917, New York, 1966, Ch. 15를 보라)
(여기서 “생산수단”은 주로 산업, 그 중에서도 국영 산업에서의 주요 기계와 장비를 의미하며, 부차적인 도구나 기구, 농업 원자재, 토지와 해외무역은 여기서는 제쳐두는 다른 문제다.)
우리가 1965년의 “개혁”에 이르렀을 때, 스탈린이 1952년에 틀을 잡은 원칙들은 흐루쇼프 시절동안 이미 많은 수정을 거쳤다. 앞서 보여진 것처럼, 흐루쇼프 치하의 국가에서 기계-트랙터배급소는 집단농장에 매각되었고, 이러한 생산수단을 상품으로 전환시켰다. 이에 더해, 중앙 산업 부처들은 폐지되었는데 이러한 계획에는 강제적인 성격이 있었다.
그 결과, “회색시장”이 광범위하게 확산되었고, 기업소 관리자들은 그곳에서 생산수단과 다른 상품들을 불법적으로 거래하였다. (연재물의 13장을 보라) 따라서 생산수단의 상품으로의 전환–기초적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복원–은 이미 흐루쇼프 시절에 상당히 진전되었다.
앞서 인용된 것과 같은 1965년 6월 모스크바 회의에서는 “소비재 뿐만 아니라 생산수단에서도 시장 문제가 존재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14장) 소련학 연구자 펠커(Felker)가 “중공업에 대한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통제로부터의 주요한 일탈”이라 칭한 것이 일주일 후에 일어났다. “많은 소련 공작기계 기업소들이 그들의 고객들과 직접거래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는 것이 발표되었다. 또한 향후 공장들의 성과는 외부 계획의 목표 달성보다는 이윤에 기초하여 평가될 것이었다” (Felker, Soviet Economic Controversies, p. 92.)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러한 공작기계들을 구매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생산 기업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기업소는 아직 지불을 위한 자금이 없었다.(적어도 법적으로는)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생산 기업소들에 대한 (지불하는 고객들의) 효과적인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특별한 행정적 조치가 요구되었다. 또한 아직은 기업소의 관리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고 생산수단의 선도시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생산수단 시장에 대한 이러한 제한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9월에 “개혁”이 일어났다.
모스크바 교통 시범공장의 경험에 대한 알렉세이 코시긴의 요약은 앞서 인용된 바 있다. 그는 이들 기업소가 “과잉된 트럭과 장비를 매각하고 과잉 인력의 고용을 중단했을 때” 번창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무엇이 “잉여” 장비를 구성하는지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생산수단을 매각할 명시적 권리는 10월 4일 소련 각료 이사회에서 승인한 사회주의 국가 생산 기업소에 대한 새 법령의 조건에 따라 기업소 관리자들에게 부여되었다. 새 법은 또한 “고정자산을 대표하는 물질적 가치의 매각으로 얻은 총액은 기업의 처분으로 남아 연간 계획을 초과하는 자본투자에 사용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은 Problems of Economics, January 1966, p. 11에서 번역되었다.)
기업소 관리자들의 처분에 자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기업소들로 하여금 그들이 창출한 이윤의 상당 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었다. (이윤이 존재한다면 과거에는 사실상 모든 이윤이 중앙으로 보내졌다.) “개혁”이 이루어진 첫 해에 기업소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평균 26%를 유지했다. 1968년에 이는 33%로 증가했고 1969년에는 40%로 증가했다. (Drogichinsky, 앞의 글, 207쪽)
이러한 이익유보금 중 가장 크고 빠르게 증가한 부분은 기업소에 의해 배정된 “생산개발기금”에 들어갔다. 여기에 기업소들은 “고정자산의 완전 갱신”을 위해 자체 감가상각자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설비의 “상각”시기 및 신규 설비의 구입 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소들은 생산수단 구매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영은행으로부터 차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식으로, 소련 사회주의 시대의 규칙 아래에서 재정적으로 “빈곤층”(paupers)이었던 기업소들은 빠르게 풍부한 유동자산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1966-67년 도매가격 “개혁”이 시행된 이후 그들의 금고는 더욱 불어났는데, [이러한 “개혁”은] 모든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기업소들이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코시긴이 연설에서 제시한 노선에 따라-착수되었다. 그리고 이는 얼마나 큰 이윤인가! 모든 산업에서 도매가격이 평균 8% 상승되었고, (주로 생산수단을 생산하는) 중공업에서의 가격은 평균 15% 증대되었다. 가격 “개혁”은 기업소들의 평균 수익율을 20%까지 끌어올렸는데, 주로 기계를 제조하는 중공업의 몇몇 부문에서는 40%가 넘는 수익율이 확립되었다. (L. Maizenberg, "Improvements in the Wholesale Price System," Voprosy Ekonomiki, 1970, No. 6. in Problems of Economics, Feb. 1971, p. 49.)
결과적으로 기업자금에 유입된 수익의 홍수는 목표로 여겨진 “자체 자금조달의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상당히 근접하기는 했다. (N. Fedorenko, "On the Elaboration of a System of Optimal Functioning of the Socialist Economy," Voprosy Ekonomiki, 1972, No. 6, in Problems of Economics, Jan. 1973, p. 21.)
1969-70년 군사부문을 제외한 소련 내 총 자본투자의 약 80%는 “중앙집중적”으로 분류되었고, 20%는 “분권적”으로 분류되었다. 후자는 기업소의 “계획” 밖의 자본투자를 나타내며, 이는 전적으로 “자체” 자금에서 비롯된다. 소위 “중앙집중적” 투자–즉,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중앙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 “계획”에 따른 것으로 분류되는 투자–중 약 73.5%(전체 소련 투자의 58.8%)가 기업소의 “자체” 자금에서 나왔다.
“중앙집중적” 투자의 나머지 23.5%(또는 전체 소련 투자의 18.8%)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중앙집중적 투자였는데, 이는 새로운 산업(주로 자동차, 항공기, 그리고 화학산업의 새로운 부문)의 설립이나 새로운 지역(주로 극동이나 시베리아)의 “발전”을 위해 국가예산에서 나온 보조금을 나타낸다. “중앙집중적” 투자의 나머지 3%(전체 투자의 2.4%)는 국영투자은행(스트로이방크)의 장기대출의 형태였다.
따라서, 기업소의 “자체” 자금으로 조달된 투자는 소련의 총 (비군사)투자액의 78.8%에 달했다. (I. Sher, "Long-Term Credit for Industry,'' Voprosy Ekonomiki, 1970, No. 6, in Problems of Economics, Dec. 1970, p. 46, and T. S. Khachaturov, "The Economic Reform and Efficiency of Investments," in Soviet Economic Reform. . . . pp. 156, 164.)
그렇다면, 1965년 “개혁”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결과 중 하나가 경제학자 V. N. 쿨리코프가 자본투자에 있어 “중요하지 않은” 역할로 정의한 지점을 은행 대출이 넘어서지 못했다는 사실이라는 점은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기본적 원인들”의 목록의 맨 위에 쿨리코프는 “자체 자원으로 자본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대다수의 기존 기업소들의 높은 수익성”을 가져온다. ("Some Problems of Long-Term Crediting of Centralized Capital Investments," Finansy SSR, 1974, No. 5, Problems of Economics, Feb. 1975, p. 61) 참고로 소비에트 문헌에서, “자체의”(own)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따옴표로 묶지 않는다.
1965년의 조치들은 요약하자면, 흐루쇼프 시대에 생산수단의 시장이 지하에서만 생겨나도록 유지했던 법적이고 재정적인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다. 흐루쇼프 치하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웠고 불법이었지만 널리퍼져있었던 상품으로서의 생산수단의 교환은 어엿하고 보편적이며, 유동성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다. 실제로 너무 공급이 잘 되어서 일부 기업소들은 “그들의” 자금을 수익성있게 배치할 수 없었지만 “자유이윤잔여분”(free profit remainder)이라 하는 것을 축적할 수 있었다. 이 경우 기업소들은 “정부가 정한 특정 이율로 고스방크[저자–중앙 상업은행 및 중앙은행]에 대출을 제공할 권리를 얻을 수 있었다.”(Manevich, "Ways of Improving. . ." Voprosy ekonomiki, 1973, No. 12, Problems of Economics, June 1974, p. 11)
기업소 내에서 기업 자금을 처분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이사진의 손으로 집중된다. 노동조합 대표단과 반드시 상의해야만 하는 “사회문화적” 목적들을 제외하면, 새로운 법령 하에서 기업소 이사진들은 얼마나, 언제, 어디에, 무엇을 위한 투자인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어떠한 내부적인 간섭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투자 결정에 있어 “노동자 자주관리”나 “노동자 상호참여” 같이, 유고슬라비아나 서독의 변종에서 그랬던 것과 같은 가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분명히 “새로운 경제시스템”은 기업소 이사진들의 역할에 있어 큰 변화를 가져왔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거나 그들의 비판을 억누를 수 없었떤 이전 시대의 기업소 이사진들은 사라졌다. 그들은 계획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감옥에 가거나 그 이상의 위험을 무릅썼다. 사라진 것은 기업자산을 “재판매하고 담보로 넣거나 썩게 내버려두”지 못했던, 그리고 교회의 쥐보다도 더 많은 투자자금을 손에 쥘 수 없었던 단순한 “국가의 대리인”은 사라졌다. 옛 기업소 이사진들은 고용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에 지나지 않았다.
흐루쇼프 치하에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은–기꺼이 또는 원치 않게–암시장 거래인, 횡령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사기꾼들로 변모했다. 상황은 이렇다 할 대안을 남겨두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변혁의 과정에서의 과도기적 단계에 불과했다. 1965년 “개혁”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종류의 기업소 이사진으로 부상했다. 그들은 생산과정의 독재자, 강철주먹의 산업가일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매의 눈을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액수의 돈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되었다
이러한 이사진들의 정치-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의 활동주기를 간단하게 추적해봄으로써 알 수 있다. 이 주기는 돈과 일정한 임금 기금과, “생산발전을 위한” 일정한 기금으로 시작된다.
이사진의 활동은 상응하는 상품, 즉 노동력과 생산수단을 구매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의 임무는 제품의 판매와 함께 처음에 지출된 돈이 증대되어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이 생산과정의 요소들을 결합하고 소비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이사진들이 생산과정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대해서는 17장에서 잠깐 살펴본 바 있다.
한 마디로 이사진의 임무는 생산과정의 요소를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가치를 창출하는 가치로서 기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 중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사진은 “과잉 장비를 매각하고 과잉 인력의 고용을 중단”한다.
사회의 더 큰 이익, 또는 사회적 계획에 따라 주어진 기업에 할당될 수 있는 꾸준한 높은 이윤율조차도 이런 종류의 이사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코토프(Kotov)가 정당하게 관찰하듯이, “기업소들은 일반적인 높은 이윤이 아니라 그들의 자금에 지급되는 이윤의 증가에 관심이 있다.” ("Prices. . ." 앞서 인용한 기사, p. 60) 꾸준한 높은 이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그리고 무한한 이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위한 이윤. 그런 다음 기업소의 자금이 다시 보충되면(이사진은 개인적으로 “할당량”을 받는다) 이 순환은 다시 시작된다.
하차투로프의 말에 따르면, “기업소 자체가 생산을 확장하고 기술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어떤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를 결정해야 한다. (...) 모든 대안들 중에서 기업소는 가장 큰 수익성 상승을 제공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The Economic Reform and Efficiency of Investments" in Soviet Economic Reform. . . , p. 156)
그러한 기업소 이사진들의 정치-경제적 특성은 무엇인가? 맑스는 한 세기 전에 “가치의 확장(...)이 주관적인 목표가 되고 (...) 운영의 유일한 동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불안한 끝없는 이윤창출의 과정만이 그가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는 그러므로 “자본가로서의 기능, 즉 자본의 인격화 및 의식과 의지를 부여받는 역할을 한다.” (Capital 1, p. 152, 강조는 저자.)
이사가 지명되고, 상부로부터 제거되며 관료제에서 확실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의 기능의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이사는 관료-자본가이지만, 자본가로 기능하기 위해 그 자리에 앉게 되며, 그 역할에 그가 실패하게 되면 관료제는 그의 의무를 면제해준다. 그의 자본주의적인 면은 결정적이고 우선적인 요소이며 다른 쪽에서 의존한다. 그러나 이것의 증거는 추상적인 추론에 있지 않으며, “새로운” 소련 관리자와 그의 쌍생아인 서구 국가와 사기업의 관리자 사이의 단순한 비교에 있지 않다. [그 증거는] 오히려 자본가로서의 소련 관리자들이 그들의 노력을 “조화”해야 하는 관료집단, 즉 중앙계획기구의 권력을 축소한 너덜너덜해진 부분에 있다.